"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나올 수 없다."
가난한 집안에서, 혹은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개천에서 용 나왔다!"는 말을 해 왔습니다.

며칠전 수능이 있었습니다. 또 각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각각 교육공약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교육 현실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월16일 경기도 여주군 어느 작은 마을.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이 이 마을을 방문해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눈 자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학부모, 교사들 20여명과 아이들 교육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세화 기획위원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갈수록 우리나라 교육은 계층 순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변호사와 의사의 자식은 역시 변호사와 의사가 될 확률이 높고, 노동자와 서민의 자식은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홍 위원은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서는 교육이 계층 순환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연구과제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즉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와 서민의 자식들이 한 사회의 상위계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화두였다고 합니다. 교육으로 계층이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한 것이죠.

결론은? '개천에서는 용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육은 계층을 순환하기 보다는 고착화시키는 흐름이 강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프랑스 교육 환경으로 넘어갔습니다. 작은 마을에 모인 학부모와 교사들의 눈빛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홍세화 기획위원은 지난 79년 남민전 사건으로 프랑스로 강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일종의 망명이라고 표현해도 될 듯 합니다. 홍 위원은 "당시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3세와 6세였다"고 말했습니다.
홍 위원은 그런데 "3세와 6세, 아이 둘이 프랑스에서 대학을 나올 때까지 교육과 관련한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홍 위원의 말을 듣고 있던 학부모와 교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타국(프랑스)으로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홍세화)가 자녀 교육을 두고 한번도 고민한 적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홍 위원은 "정말이다. 프랑스에서 자녀 둘이 대학을 나올 때까지 교육문제에 만큼 고민한 적이 없다"며 "그것은 프랑스 교육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프랑스는 알다시피 '대학평준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홍 위원의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모두 13개의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파리1대학에서 부터 파리13대학까지 있는 것이죠. 또 프랑스 리옹에는 리옹1대학에서 4대학까지 4개의 대학이 있답니다.
헌데 재밌는 것은 파리에 살다가 리옹으로 이사가야 하는 대학생이 있는 경우 전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파리대학을 다니다가 리옹으로 이사하는 경우 리옹대학으로 전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대학간 전학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편입학은 있지만 이른바 대학별 등급이 있기 때문이죠. 프랑스에서 이러한 대학간 전학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 위원의 말을 전합니다.
"프랑스는 모든 대학이 평준화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파리에 있다가 리옹으로 이사하더라도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을 다니면 됩니다."
프랑스에 있는 모든 대학이 평준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입학자격시험(바깔로레아 baccalaurat)이 있다고 하는군요. 홍 위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 프랑스 학생들은 바깔로레아를 보게 됩니다. 20점 만점인데 10점 이상을 받으면 대학을 갈 수 있죠. 바깔로레아를 보는 학생중 약 70%가 10점 이상을 받습니다."
10명중 7명은 대학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8점과 9점을 받은, 아깝게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재시험의 기회를 준답니다. 이중에서도 약 10%의 학생이 통과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종합해 보면 바깔로레아를 치르는 10명중 8명 정도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홍 위원은 프랑스의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상교육입니다. 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학생들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홍 위원이 학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대학원까지 무상으로 교육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과 홍 위원의 질문에 학부모들이 머리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게 되면 자기자신의 안락한 삶을 우선하기 보다는 사회환원 의식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교육시킨 국가에 대한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홍 위원은 우리의 교육과 관련된 가치관의 심각한 차이를 설명해 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점 만점 중 16점 정도를 받으면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군요. 예컨대 철학에서 16점을 받았다면 '철학에 있어서 완벽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죠.
홍 위원은 "프랑스에서 20점 만점중 16점은 우리나라 100분율 점수로 따지면 80점 정도된다"며 다시 학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0점이면 어느정도의 평가를 받습니까?"
어떤 학부모는 '음...그 정도면 괜찮은 점수 아닌가'하는 표정으로, 또 다른 학부모는 "글쎄...그 정도 점수 가지고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 등 다양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홍 위원의 이어지는 설명에 학부모들은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0점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80점이 완벽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 학생이 받은 80점이 '전체에서 1등의 80점인가' 아니면 '꼴찌의 80점인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50명의 학생중 80점이 1등이면 그 점수는 '완벽한 점수'가 되는 것이고, 50명의 학생중 80점이 50등이면 그 점수는 '아주 쓸모없는 점수'가 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완벽한 80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등급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는 것이죠.
홍 위원은 이어 대학에 대한 서로 다른 관념도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을 입학하기는 쉽지만 졸업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학에서도 의과대학이 인기 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80% 이상이 낙제를 받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낙제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학만 들어가면 거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그 순간, 하나의 목표는 쟁취했다고 보는 것이죠. 스스로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대학은 '철저한 경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한 순간 공부하지 않으면 바로 낙제라고 하는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가 먼저 밀려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 위원은 자신의 자녀가 중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 주었습니다.
"학교와 가정 사이에 '가정통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데 어느날 가정통신문에 "왜 아이를 새벽 1시에 재웠습니까? 앞으로 절대 그렇지 말았으면 합니다"라는 선생님의 통신문이 있더군요."
그 전날 홍 위원의 자녀가 소설을 읽다가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다음날 학교에서 졸았는데 선생은 그 이유를 물었고 그 이유를 들은 뒤 부모에게 그런 통신문을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침 7시 이전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었죠."
작은 마을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홍 위원의 말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한 켠으로는 답답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홍 위원의 프랑스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를 한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 위원의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교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프랑스 이민은...어떻게 가는 겁니까?"
참석한 학부모들과 홍 위원, 모두 웃었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교육 현실이 그런 웃음을 만들게 한 요인이겠죠. 여전히 아이들은 '0교시'를 하고 있고 자신의 점수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면서 철저하게 등급이 매겨지는 곳!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씁쓸한 웃음을 머금게 한 '어떻게 프랑스로 이민갑니까'라는 질문은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자화상 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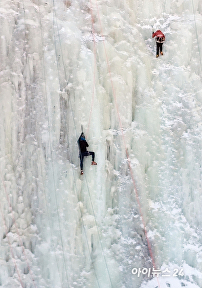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